
[미디어파인 칼럼=변유정의 독자적(讀者的) 시선] 헤르만 헤세의 명작 「데미안」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대개 데미안이 살아있지 않은 존재라는 견해에 무게를 둔다. 다시 말해 데미안은 비존재(非存在)로서 주인공 싱클레어의 내면적 이상향이라는 말이다.
데미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싱클레어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자아라는 견해에는 저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이나,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이상향이라는 근거는 책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초상을 그리는 부분에서 그를 묘사하는 장면과, 포탄을 맞아 병석에 누워 있는 싱클레어 앞에 나타난 데미안의 말을 꼽고 싶다.
전자는 “그것은 신과 같은 초상의 일종이거나 신성한 가면처럼 보였고, 절반은 남성적이고 절반은 여성적이었으며, 나이를 초월한 모습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강한 의지가 엿보였으며, 남모를 생명력이 충만하면서도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보였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고, 나 자신 속에 존재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는 진술이고, 후자는 “자네는 아마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 그 땐 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쉽게 말이나 기차를 타고 갈 수 없을 거야. 그럴 때에는 자넨 자기 자신의 내부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너의 내부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대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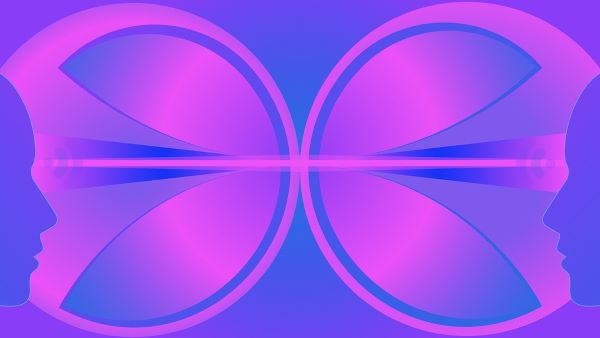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 데미안은 (일정 순간부터) 싱클레어에게 초월적 존재이며 내면적 존재로서 싱클레어가 선망하는 자아(自我)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역경에 처했을 때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조언해 싱클레어에게 길을 열어준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그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데미안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싱클레어는 위안을 얻는데,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멀고 먼 운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싱클레어는 의미나 목적 없는 방황을 이어가면서도 데미안을 그리워하며,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데미안의 초상을 그려내고, 마침내 자신의 내면에서 데미안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모든 에피소드는 두 가지를 가리킨다. 첫째, ‘운명의 목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방향은 현저히 다를 수 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선망함으로써 인생의 결정적 순간들에 데미안을 만난다. 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순전히 싱클레어에게 달려 있지만, 그는 데미안의 목소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다시 싱클레어에게 돌아와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둘째,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 싱클레어가 이토록 힘들여 자아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결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책은 세계대전 발발 전의 혼란스러움을 반영한다. 명과 암의 “두 세계”로 대변되는 그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느끼며 방황하는 등장인물 싱클레어를 통해, 헤세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나’라는 주체적 의식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말하는 셈이다.
현대는 또 다른 ‘전쟁’ 속에 있다. 많은 전쟁들이 그러했듯, 이 전쟁에서도 경쟁과 비교로 자아가 확립된다. 틈새시장은 듣기도 지겨운 ‘힐링’이 장악했다. 물론 힐링으로 아무 것도 치유할 수 없다는 점은 유머다. 모든 것이 피곤해진 청춘들, 이 시대의 싱클레어들은 방탕해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며 내면에 품었던 데미안을 잊으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데미안은 말한다. “방탕한 생활은 신비주의자가 살기 위한 최선의 준비 활동이란 말이지. … 우리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들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들어 있어.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이 순간, 헤세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