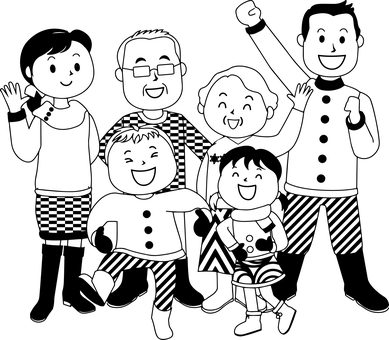
[미디어파인 칼럼=김경아의 ‘특별한 당신’] 멀찍이 친정집이 보이나 싶더니, 집 앞을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온다. 가는 중이라는 전화를 한 지도 한참 인데, 언제 부터 나와 계신 걸까. 해 떨어진 저녁녘, 여전히 쌀쌀한 날씨에 새빨개졌을 아버지의 빨간 코끝이 내 코끝을 시리게 한다. 이리로 오라 휘휘 저어 손짓하는 아버지 덕에, 좋은 자리에 쉽게 차를 댔다. 어느 해 부턴가 봉숭아 물 들이던 넓은 마당의 영진이네도, 구슬치기하고 고무줄놀이 했던 기홍이네도, 하나 둘 집을 허물더니 반듯반듯한 원룸들이 들어서 골목마다 주차하기가 여간 어려워진 게 아니다. 혹시라도 먼 길 달려온 딸네가 주차에 애먹을까 싶어 미리 나와 꽃샘추위와 마주하고 계셨을 아버지의 속 깊은 배려가 감사하고 죄송하여 또 한 번 코끝이 시려온다. 내 인생의 폭풍우도 이런 모습 이었을 테지... 바람에 나부끼랴 폭우에 젖으랴 나보다 먼저 내 앞에서 폭풍우를 맞이하고, 우비를 입히고 우산을 씌어 인생길에 내보내셨을 테지,,. 혼자 가는 인생길, 홀로 가지 않게 멀리서 뒤에서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피고 또 살펴주셨을 테지... 알게 모르게 응원하고 지원해준 아버지의 사랑이 고마워 시린 코끝을 훌쩍인다.
“하비~!!!” 차창 밖으로 할아버지를 본 딸 아이가 발 동동 구르며 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아이고, 우리 지아 왔어요! 지아, 하비 보고 시포쏘요??” 서른 다서 해가 지나도록 들어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콧소리. 나긋나긋한 애교 섞인 그 소리가 신기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숨죽여 웃고 있자니, 그 옛날 흑백의 옛 시절로 돌아간다. 어릴 때 ‘노란색’을 좋아하면 아빠를 좋아하는 거라는 근거 모를 이야기 마냥, 어린 시절 나는 ‘노란색’을 그리도 좋아했다. 노란 개나리도 좋았고, 노란 색연필도 좋았다. “얘는 항상 아빠편이야.” 놀려대듯 서운해 하던 엄마의 푸념처럼 아빠가 하는 거 고대로 따라하고, 아빠가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싶어 했던 나는, 요샛말로 ‘아빠바보’였던 셈이다. 늦은 밤, 야식 봉지를 들고 오던 아빠의 그 맛있는 냄새가 좋았고, 가끔 집 앞 포장마차로 불러 우동이며 꽁치구이를 시키고 한 잔 술을 기울이는 아빠의 그 시큼한 술 냄새가 좋았다. 유난히 영화보기를 좋아했던 아빠와 나, 그리고 곱슬머리 남동생. 우리들은 늦게까지 안 잔다 잔소리하는 엄마 몰래 비디오가게를 가곤 했는데, 잠옷바지 속에 비디오테이프를 숨겨 조심조심 걸어 들어오다 통 넓은 바지사이로 쏙 빠져나가 배꼽 잡았던 어느 날이 무척이나 그립다.

“어서 들어와. 밥 먹자~.” 아빠 사랑을 되뇌며 현관에 들어서니, 맛좋고 냄새 좋은 ‘엄마 밥’이 한상 가득이다. 조물조물 무치고 볶고 끓이고 부치고, 먹성 좋은 사위가 한 입에 쏙 넣을 전부터 후후 불어 떠먹을 얼큰한 갈비찌개까지. 분주히 장만한 엄마손 맛 먹거리들에 젓가락이 들썩거린다. 버팀이 될 만한 것이면 무조건 잡고 서는 통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8개월 둘째 아이 때문에 부스터 없는 외식은 꿈도 못 꾸는 요즘 날들. 천천히 밥 먹으라며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는 엄마 덕에 오랜만에 뜨끈한 밥 다운 밥을 먹었다. 식은 국에 밥 말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손주 이유식까지 금세 만들어 내시더니, 좀 전에 먹은 젖병을 닦고 소독할 물을 끓이신다. 아.. 먹고 또 먹고. 누워서 상큼한 오렌지를 까먹으며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는 여유를 부려본 때가 언제인가.
완벽하게 무장해제 되는 친정의 마법.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귀하다. 긴 생머리를 날리며 캠퍼스를 누비던 시절, 귀 만큼이나 아니 귀보다 더 커다란 귀걸이를 귀에 걸고 또각또각 하이힐을 신고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어야 제 맛이었다. 그 좋아하던 귀걸이도 아가 다칠세라 안 한지 오래요, 하이힐은 진즉에 신발장 구석에 넣어뒀다. 과일이며 이유식이며 온갖 것을 묻히고 빨아대는 아이들 덕에 하얀 옷은 입을 엄두도 못내는 엄마가 되어버린 나.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 생머리 아가씨가 질끈 묶어 올린 머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뜯기는 엄마 모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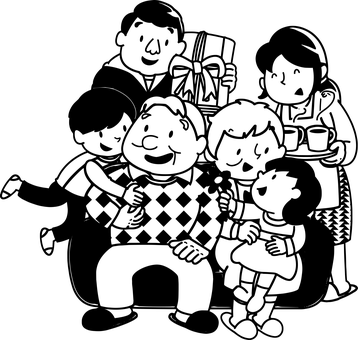
여전히 엄마 아빠 품에서 응석부리고 멋 부리며 내 꿈을 향해 달려 나가고픈 마음이 한 켠에선 꿈틀거리지만, 가슴에 얼굴을 부벼대며 방긋거리는 귀염둥이들을 보고 있자니 멋쟁이 꿈들은 오늘 또 잊어버리고 만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 늦게까지 고된 미용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필요할 땐 달려 와주고 먹고 싶은걸 순식간에 내어놓는.. 그래도 매일 엄마는 왜 이렇게 바쁘냐며 불평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엄마’는 엄마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늦은 밤 지친 어깨를 늘어뜨리고 퇴근하면서도, 그 무거운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쉬는 날에는 놀이동산에 가자 떼쓰는 나를 위해 과자사주며 안아주는.. ‘아빠’는 아빠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못난이도 이렇게 못난이가 없다. 코 찔찔이 철없는 못난이가 새끼를 낳아 물고 빨고 웃고 울며 엄마얼굴을 닮아 가다보니 이렇게 코가 시큰거릴 수가 없다. 고요한 새벽, 칭얼대는 손자 우유를 먹이며 졸고 있는 엄마를, 하루 종일 졸졸 쫓아다니며 놀아 달라 떼쓰는 손녀를 품에 안고 코골며 주무시는 아빠를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방 구석에 숨죽여 훌쩍거려지는 것이, 여전히 못난이 모습 그대로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 철이 든다던데 친정집에 오자마자 널 부러져 쉴 곳을 찾아 헤매는 못난이는 아직도 멀은 듯 싶다.

이른 아침, 눈 뜨자마자 할아버지 손 잡고 “장난감 사주세용~~.” 애교부리는 못난이의 딸과 함께 마트에 가니, 저 멀리 할아버지 모습 그대로 뒷짐 지고 할아버지와 나란히 걸어가는 그 모습에 너털웃음이 난다. ‘사랑’이라는 말이 부족한 나의 영원한 버팀목 부모님. 지금의 내가 그렇듯, 어느새 엄마 아빠의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소녀 소년이었을 그들이 견뎌온 시간과 역경을 헤쳐온 지혜가 간절하다.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이 더해진 요즘에 비하면 말도 못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바쁜 날들을 기저귀 빨고 널며 어찌 헤쳐오신 걸까. 똥 묻은 일회용 기저귀를 버리며 냄새 난다 힘들다하는 푸념이 부끄러워지는 지금, 그 옛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고 싶다.
백년이 지나도 철없을 못난이가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삼아도 부족한 귀한 부모님을 닮아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의 행복과 처절한 전투를 반복하는 초보 엄마의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싶다. 물색없이 이 것 저 것 친정집의 좋은 것들을 가방가득 챙겨 넣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갛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또 한 번 못난 코를 훌쩍인다.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당신’. 부모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돌아서니 고새 또 그 감사한 얼굴이 보고 싶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