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파인= 준원장의 아이케어] 인간 승리로 불린 만한 시각장애인 두 분을 소개하는 기사를 지난 주 읽게 됐다. 우선 시각장애인 최초로 대학 총장이 된 총신대 이재서(66세) 명예교수다.
그는 어릴 적 앓은 열병의 후유증으로 14세 때 시력을 완전히 잃은 후 고학으로 총신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해 사회 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 총장은 “실명(失明)은 축복 이었다”고 말하지만 처음 실명했을 땐 절망했다고 한다. 전남 순천 산골이 고향인 그는 초등학교 때 5㎞ 등하굣길 풍경, 만났던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지만 라디오도 없던 시절 보지 못하는 하루는 너무 길었다고 술회한다.
그는 지금까지 역경을 이겨온 삶의 원동력으로 인내를 꼽았다. 그에게 상담 요청을 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고통 역경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고 감지하지 못하는 미래가 있다. 참고 기다려 보자”며 다독여 준다고 한다.
신문 기사로 소개된 또 다른 시각장애인도 최초 소유자다. 영어 교사 김헌용 씨는 서울에서 중증 1급 시각장애인으로는 첫 일반 학교 교사다. 일반인도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통과해 벌써 10년 차 영어교사다. 2015년엔 번역전공으로 한국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직장인 밴드의 기타리스트, 영어통역 봉사, 강연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다섯 살 때 시력을 잃기 시작해 대학생 때 완전히 깜깜한 세상을 만났다. “이런 것도 내 삶이구나”하고 받아들일수록 재미가 들렸다는 그는 못 보니까 귀로 듣는 것에 더욱 파고들어 일반인보다 보다 더 섬세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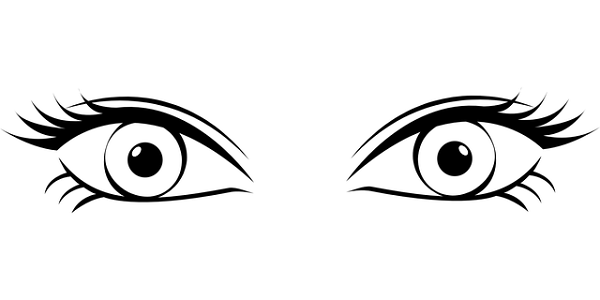
“눈이 보였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고 인터뷰한 내용은 체험에서 나온 깊은 삶의 성찰로 느껴졌다.
실명을 축복이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역경을 이겨낸 두 분의 인생역정은 참으로 대단하다. 40대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안 증상만 느껴도 당황스러워 하는 것과 크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물론 실명과 노안을 수평 비교할 수 없지만 노안 증상에도 눈에 큰 병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대로 노안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지내다가 병을 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노안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다. 당시 노안 라식 수술의 효과는 크지 않아 5년 지나면 다시 노안이 온다고 들 했다. 의사들도 다초점 렌즈 수술을 자신 있게 권유하지 못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노안 증상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눈에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라고 말했던 때도 있었다 한다. 안심하라는 의사의 말이 환자에게 반갑게 들릴 수 있었겠는가.
이제는 달라졌다. 기술 발달로 수술이 간편해졌고 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백내장 수술을 통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영구적인 노안 교정을 목표로 할 정도다.
그래도 ‘눈이 보배’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루에 일정 시간은 노안 증세를 재촉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휴식을 주는 것도 보배를 지키는 일이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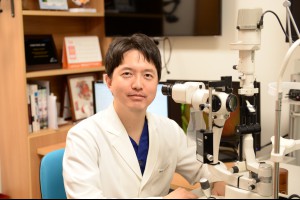
[김영준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세브란스 병원 안과전공의 수료
現 아이준 안과 대표원장
대한안과학회 정회원
대한안과의사회 정회원
노안·백내장 수술 1만 케이스 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