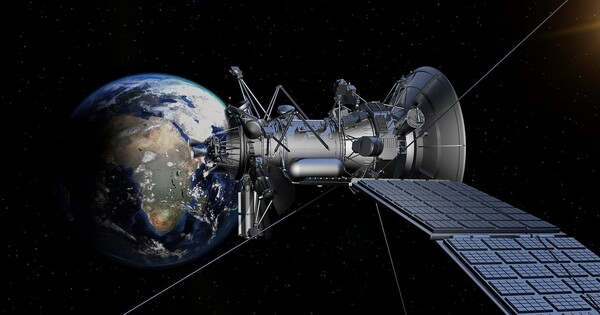
[미디어파인=이상원 기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연간 약 200개의 물체가 우주로 발사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수치가 2,600개를 넘어섰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감소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부터 로켓 잔해까지, 우주 활동이 급증한 만큼 지구 궤도에는 수많은 우주쓰레기가 쌓여 왔다. 그 결과, 이미 많은 위성들은 기존에 떠돌아다니는 파편과 충돌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ISS) 역시 종종 궤도를 변경해 파편 충돌을 피해야 할 정도다.
현재 10cm 이상 크기의 인공 쓰레기만 해도 25,000조각 이상이 지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발사체가 늘어날수록 잔해끼리 충돌할 위험도 커지는데, 이들은 총알보다 최대 15배 빠른 상대속도로 움직이며, 새로운 파편을 무수히 만들어낸다. 2009년 작동을 멈춘 러시아 위성 ‘Cosmos 2251’과 미국 이리듐 위성이 충돌해 약 2,000개 파편을 발생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 중 상당수는 여전히 추적 대상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구 궤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스페이스X, 원웹(OneWeb),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Project Kuiper)’ 등이 이 자원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특히 스페이스X는 이미 지구 상공에서 작동 중인 위성의 대부분을 소유·운영 중이며, 전 지구적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향후 수만 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아마존 역시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236개의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조율 없이 각자가 위성을 무제한으로 발사하다가는, 결국 아무도 궤도를 활용하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특히 저궤도(LEO·지상 2,000km 이하)를 중심으로 우주 공간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그 이상의 고궤도까지 연쇄적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 온 지속적인 통신, GPS 지도, 인터넷, 지구 관측 등 각종 위성 서비스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위성은 ‘일회용 플라스틱’처럼 한 번 쓰고 나면 결국 폐기물이 된다. 이는 공동 자원을 무분별하게 소진해 결국 전체가 피해를 보는 ‘공유지의 비극’을 우주에서도 반복하는 격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우주 환경을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 우주경제’에서 벗어나, 재활용·재사용 등 건전한 자원 관리 원칙을 적용하는 ‘순환 우주경제’를 추구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와 마찬가지로, 우주 역시 보존해야 할 환경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주 활동이 지구 환경에 직결된다는 점도 중요한 이슈다. 위성·로켓의 생산과 발사는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지구 기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로켓 발사 시 탄소 배출뿐 아니라 그을음, 알루미늄 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또, 임무를 마친 위성이나 로켓 단계를 그대로 대기에 재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파편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2024년에는 스페이스X의 드래곤 서비스 모듈 잔해 일부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산악 지대로 떨어졌고, 국제우주정거장의 일부가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주택 지붕을 뚫고 내려오기도 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구에서 확산 중인 순환경제 개념을 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순환 우주경제’다. 제품이 사용 후 버려지는 선형 경제 대신, 생산단계에서부터 재사용·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폐기물을 최소화한다는 원리다. 첫 단계는 독성 물질 배출이 적고, 쓰레기가 덜 나오는 재료로 위성과 로켓을 설계하는 일이다. 이후 고장이 난 위성을 궤도에서 직접 수리해 수명을 연장하고, 필요하다면 폐위성 부품을 재활용해 새로운 임무에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미 떠도는 우주쓰레기를 수거·재처리해, 충돌 위험을 낮추고 귀중한 자원까지 회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물론 이런 순환 우주경제를 실현하려면 기술적 혁신이 필수적이다. 현재 궤도 위 대부분의 인공위성은 수리가 불가능하고, 수리 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기관도 아직 제한적이다. 하지만 만약 로봇팔이나 도킹 기술을 활용해, 수명이 다해 가는 위성에 접근·수리·재급유·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다면, 이를 대체할 새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드는 자원과 비용, 그리고 배출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법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주자원 채굴과 소유, 우주 환경 보전 등의 문제는 모두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폐위성을 재활용하거나 새 위성으로 만드는 방안도 큰 과제다. 보통 임무를 마친 위성은 곧바로 우주쓰레기로 전락해, 전혀 다른 신재료로 만든 새 위성에 자리를 내준다. 이는 마치 중고차를 버리고 계속 새 차만 생산하는 것과 비슷한 낭비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주에서 폐위성의 부품을 떼어내 새 위성에 결합하거나, 부품을 갈아끼우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미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은 한 발 앞서 시행되고 있다. 스페이스X는 발사 후 분리된 ‘팰컨 9’ 로켓 부스터를 지상에 수직 착륙시켜 재사용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최대 30%의 발사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발사체 폐기물도 크게 줄였다. 문제는 현재 이런 시스템을 쓰는 곳이 사실상 스페이스X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재사용 로켓 개발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위성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 역시 이어지는 중이다. 노스럽 그루먼의 ‘SpaceLogistics’는 인공위성의 연료 부족을 보완해 수명을 늘려주는 ‘미션 익스텐션 비히클(MEV)’을 개발해 2020년부터 운용해왔다. MEV는 연료가 거의 떨어진 인텔새트 위성에 도킹해, 자체 추진력을 이용해 궤도를 조정하고 작동 수명을 늘려준다. MEV 발사는 새 위성을 처음부터 만드는 비용의 절반가량에 불과할 뿐 아니라, 로켓 발사 횟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 우주쓰레기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억제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궤도에 남은 우주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또 다른 도전이다. 그물이나 작살, 갈고리처럼 여러 아이디어가 고안되고 있지만, 쓰레기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한계가 많다. 이미 궤도에서 제어되지 않는 물체는 회전 운동(‘텀블링’)을 하면서 떠다니기 때문에, 이를 잡아 끌려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추진체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의미 있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기업 아스트로스케일은 2021년 ‘ELSA-d’(End-of-Life Services by Astroscale Demonstration) 임무를 통해 두 대의 위성을 함께 쏘아 올렸다. 하나는 고장난 위성을 모사한 모형, 다른 하나는 이를 수거할 ‘서비스 위성’이었다. 두 위성은 궤도에서 성공적으로 도킹 후 분리해, 향후 실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검증했다. 아스트로스케일은 2024년 또 다른 임무 ‘ADRAS-J’(Active Debris Removal by Astroscale-Japan)를 진행해 더 정교한 기술을 시험할 계획이다.
결국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고 민간 분야까지 적극 가세하면서, 우리는 ‘쓰고 버리는’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우주라는 무대에서 절감하고 있다. 지구의 환경과 마찬가지로 우주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지키고 가꿔야 할 자원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순환 우주경제’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