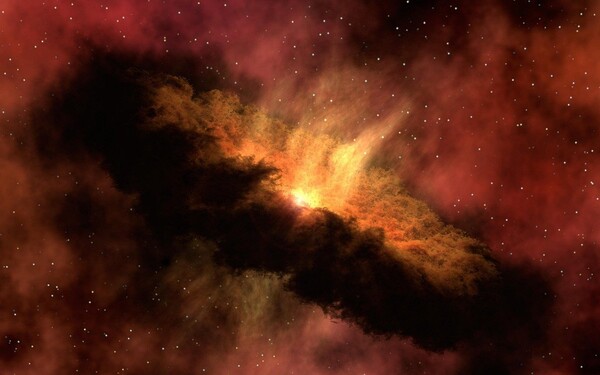
[미디어파인=이상원 기자] 2억7천만 광년 떨어진 먼 은하 한가운데, 우주 과학자들을 사로잡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 이 정체불명의 현상이 완전히 규명된다면, 우주 전역에서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는 방식을 뒤바꿀 만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대상은 용자리(드라코) 방향에 자리 잡은 은하 1ES 1927+654다. 이 은하는 태양 질량의 백만 배 이상 되는 초질량 블랙홀을 중심에 품고 있는데, 이런 거대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것 자체는 흔한 편이다. 정작 놀라운 점은 2018년, 이 블랙홀이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을 일으킨 데 있다. 당시 블랙홀 주변을 둘러싼 수십억 도에 달하는 고온 코로나(플라스마 구름)가 사라져버렸고, 이후 3개월 가까이 정상 상태를 잃었다가 다시 모습을 되찾았다.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블랙홀 근처로 운 나쁘게 다가갔다가 갈가리 찢긴 별이 방출한 물질이 급격히 빨려 들어가는 ‘조석 붕괴(tidal disruption) 이벤트’로 추정했지만, 이후 진행된 관측에서 생각보다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홀이 다시 조용해지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강렬한 전파 방출과 함께 엑스선이 빠른 속도로 깜빡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초질량 블랙홀 주변에서 이렇게 다채롭고 역동적인 현상이 연달아 포착된 것은 전례가 없다.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조석 붕괴 이벤트만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메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 카운티 캠퍼스의 천문학자 아이린 메이어는 국제공동연구팀과 함께 지상 및 우주 망원경을 활용해 1ES 1927+654의 전파 방출을 추적했다. 메이어가 처음 이 블랙홀을 접했을 때는 “평범하고 희미한 전파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느꼈지만, 갈수록 이상한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블랙홀은 정말로 특이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메이어 팀의 관측 결과, 전파 방출이 급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블랙홀이 빛의 3분의 1 속도로 날아가는 거대한 플라스마 제트 쌍을 양방향으로 토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런 제트 생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측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초질량 블랙홀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활동의 명확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별이 파괴되는 흔한 조석 붕괴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 아닐 경우, 과연 무엇이 이런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을까.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박사 과정인 메건 매스터슨이 이끄는 연구진은 엑스선 망원경 XMM-뉴턴의 관측 자료를 분석하던 중, 블랙홀에서 나온 엑스선이 한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깜빡거리다가 점점 더 빠른 주기로 바뀌어 가는 현상을 확인했다. 매스터슨은 “2022년에는 18분 간격으로 진행되던 이 깜빡임의 주기가 2024년쯤에는 7분으로 단축됐다. 초질량 블랙홀 주변에서 깜빡임의 간격이 이런 식으로 크게 변하는 현상은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이런 엑스선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 블랙홀과 매우 가까운 곳을 공전하는 ‘무언가’가 내는 간접적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블랙홀 주변에는 강착원반이라 불리는 소용돌이치는 물질의 층이 존재하는데, 만약 정체불명의 천체가 이 강착원반을 뚫고 지나간다면 엑스선이 휘몰아치듯 뿜어져 나올 수 있다. 또 이 ‘무언가’가 서서히 에너지를 잃으면서 블랙홀 쪽으로 더 가깝게, 더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중력파가 방출되면서 공전 주기가 짧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매스터슨은 이 공전체가 계속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블랙홀에 완전히 흡수되는 시점이 2024년 1월쯤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만약 이 추정이 맞는다면 그 시점에는 엑스선 깜빡임 역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2024년 3월 진행된 XMM-뉴턴 관측에서 깜빡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주기는 대략 7분으로 유지됐으며, 이는 이 가상의 동반 천체가 블랙홀 경계면인 사건의 지평선에서 몇 백만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중력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이런 거리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감안하면, 이 천체는 이미 파멸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에 대해 매스터슨은 “중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물리 현상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때 매스터슨과 동료들은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새로운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다. 바로 백색왜성의 물리학이다. 백색왜성은 태양과 비슷한 별이 수명을 다했을 때 남기는 밀도가 매우 높은 잔해다. 만약 이 동반 천체가 작은 블랙홀이었다면 이미 초질량 블랙홀과 합쳐졌을 것이고, 일반적인 별이었다면 블랙홀 근접 과정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조석 붕괴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런데 질량이 작고 지구 정도 크기를 지닌 백색왜성이라면, 블랙홀에 완전히 찢기지 않으면서도 일부 물질만 천천히 공급해 강착원반을 지속적으로 교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력파로 인해 원래라면 블랙홀에 점점 다가가야 하는 공전이, 백색왜성의 물질 유출과 함께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중력파 천문학을 연구하는 키아라 민가렐리 역시 이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백색왜성이 블랙홀에게 조금씩 갉아먹히면서(물질을 제공하면서) 강착원반과 상호작용한다면, 동시에 중력파를 내보내며 ‘조금씩’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가설은 아직 가장 유력한 ‘추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한다.
이를 증명할 핵심 도구로 과학자들은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유럽우주국(ESA)의 우주 기반 중력파 관측장비 ‘리사(LISA)’를 기대한다. 만약 1ES 1927+654 주변에 백색왜성이 사실상 정체된 채 머물고 있다면, 리사는 그중력파를 직접 감지해 지금의 가설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블랙홀이 갖고 있던 코로나(플라스마 구름)와의 상호작용 때문이었다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유력해질 수 있다. 2018년 갑자기 사라졌다 돌아온 코로나가 전파 폭발, 거대 제트 분출, 엑스선 깜빡임 등 일련의 재앙적 이벤트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메이어는 “이제 우주는 고정된 풍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현장으로 다가온다”며 “지난주엔 없던 무언가가 다음주에 갑작스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관측 천문학에 완전히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