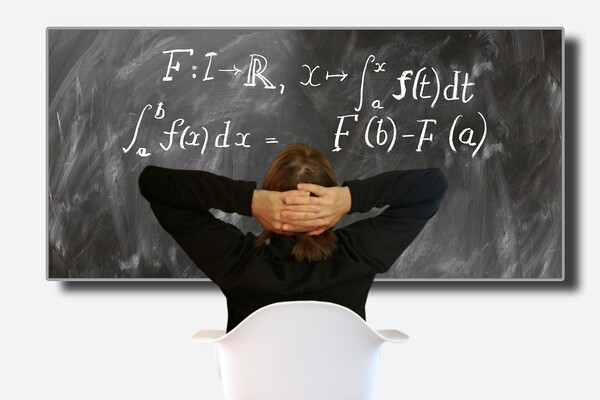
[미디어파인 = 이상원 기자] 지난 50여 년간 이론물리의 스타로 군림해온 ‘초대칭 슈퍼입자(supersymmetry, SUSY)’가, 거대한 입자 가속기 실험에서도 끝내 발견되지 않으면서 그 지위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 등 해결하기 힘든 우주 미스터리에 ‘초대칭 입자’를 후보로 삼아 왔으나,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대형 강입자가속기(LHC)가 2012년 힉스 입자를 찾은 뒤에도 초대칭 관련 신호는 더 이상 찾아지지 않고 있다. “초대칭은 1990년대부터 2015년 무렵까지 물리학계 최대 산업처럼 군림했지만, LHC가 충돌 에너지를 높인 뒤에도 어떤 초대칭 징후도 나오지 않은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프랑스 이렌-졸리오 퀴리 연구소(IJCLab)의 이론물리학자 아담 팔코프스키 박사는 평가한다. 그간 초대칭은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진실’로 취급돼 왔으며, 학계의 지원·고용 측면에서 최우선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1970년대 초, 표준모형(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기본이론)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로서, 구소련과 미국의 이론물리학자들이 개발한 초대칭은 “표준모형의 모든 입자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퍼파트너(superpartner)’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론가들은 곧 이 구조가 복잡한 문제들을 풀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예컨대 초대칭 입자는 암흑물질 후보가 되고, 양자중력 이론(끈이론 등)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왔다. 그래서 LHC 건설을 추진하는 논리에도 초대칭은 핵심 근거로 언급됐다. 그러나 수십 년간 충돌실험에서 별다른 발견이 없었고, 그때마다 초대칭 이론은 더 높은 질량 범위로 파트너 입자를 ‘재조정’해 가며 검증을 피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LHC가 2015년 충돌에너지를 13TeV로 끌어올리고도 수퍼파트너를 못 찾으면서, 한때 견고했던 초대칭 지지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LHC의 대표 실험 중 하나인 ATLAS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초대칭 전담 그룹을 없애고, 남은 관련 연구를 ‘히그스·다중보존·초대칭(HMBS)’이라는 보다 폭넓은 새 그룹에 통합했다. 이전에는 초대칭 그룹이 ‘신물리(new physics)’ 탐색의 중심이었고, 실제로 우대받는 분위기였기에 이러한 구조 재편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또 다른 대표 실험 CMS 역시 2년 전부터 초대칭 전담 그룹이 아닌, ‘동일한 관측 신호’를 활용하는 다른 연구를 함께 다루기 시작해, 올해 1월 ‘새 물리와 표준 물체(NPS)’ 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CERN에서 CMS NPS 그룹을 이끄는 세실 까이올 박사는 “이런 재편은 규모 균형과 분석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여전히 해당 그룹의 3분의 1 정도는 초대칭 연구지만, 이제 독립 그룹이 아니라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ATLAS HMBS 그룹의 사라 알더웨이럴트 박사(에든버러대)도 “초대칭 연구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다만, 힉스나 다중보존과 같은 분석과 함께 묶여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초대칭을 지지해 온 연구자들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흐름이지만, 일각에선 물리학계가 오랜 세월 ‘초대칭이야말로 답’이라며 과도하게 몰입해 온 것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초대칭이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다. 팔코프스키 박사는 “초대칭 그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LHC에서 찾기엔 너무 높은 질량 범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표준모형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단일 후보였던 시절은 지나간 듯하다는 게 중론이다. “과학은 유행을 탄다. 한때 대다수가 초대칭을 거의 성경처럼 믿었지만, 지금은 새롭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글래쇼 교수는 강조했다. LHC는 여전히 더 많은 충돌 데이터와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결과를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초대칭 대망론’은 이제 옛 영광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