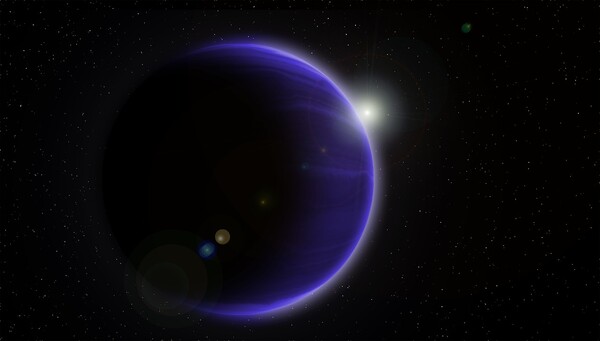
[미디어파인 = 이상원 기자] 오랫동안 인류는 태양계 밖 별들을 돌고 있는 행성이 존재할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1992년 마침내 첫 번째 외계행성 발견이 공식 발표되면서 이 상상이 현실이 됐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88년에 이미 근처 별 감마 세페이 A 주위에서 행성을 찾았다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다만 데이터 불확실성으로 인해 곧 철회됐다가 2003년에 되살아나 공식 확인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역사의 맨 앞자리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미국 천문학자 벤 주커맨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최초의 ‘외계행성 존재 증거’는 훨씬 더 오래된 1917년 관측 데이터에 있었다고 한다. 바로 네덜란드계 미국인 천문학자 아드리안 판 마넨이 관측한 ‘판 마넨 2(Van Maanen 2)’라는 별에서, 당시에 이미 외계 행성계 흔적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를 기록했던 것이다. ‘괴상한 항성’ 판 마넨 2 1917년, 판 마넨은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별을 찾기 위해 시선운동(고유운동)이 큰 별에 주목했다.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배경 별보다 빨리 움직여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찾아낸 게 지구로부터 약 13~14광년 거리의 판 마넨 2였는데, 문제는 이 별이 ‘뜨겁다’는 관측치와 ‘매우 어둡다’는 사실이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만약 정말 뜨거운 별이었다면 밤하늘에서 맨눈으로도 밝게 보였어야 했지만, 실제론 망원경 없이는 관측이 불가능할 만큼 희미했다.
이 난제는 이후 판 마넨 2는 소위 백색왜성이라는 결론으로 풀렸다. 중간 질량의 별이 수명을 다해 외피를 날려 버리고 중심핵만 남은 상태, 즉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의 온도를 닮았지만, 실제로는 지구 정도 크기에 태양 질량에 필적하는 밀도만 초고밀 천체다. 1세제곱센티미터(6면체 주사위 크기 정도)의 물질이 무려 1톤에 달할 수 있을 정도로 밀집되어 있다. 최초의 ‘오염된’ 백색왜성 판 마넨 2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단독 백색왜성’이라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별 분광(spectrum)으로 구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별의 대기에선 칼슘(absorption line)이 눈에 띄게 검출됐다. 보통 백색왜성은 엄청난 중력 탓에 무거운 원소가 금세 가라앉아 대기에서 사라지기 마련이라, 수소·헬륨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금속이 섞여 있으면 ‘오염된(polluted) 백색왜성’이라고 부른다. 판 마넨 2가 딱 그러한 사례였다.
이상한 현상의 해답은 2000년대에야 분명해졌다. 일부 백색왜성이 과도한 적외선(infrared)을 방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별 주위의 먼지 원반(debris disk)이 있음을 시사한다. 원인은 오래전 행성 형성기에 만들어진 소행성 등이 백색왜성 중력에 끌려와 부서지고, 그 잔해(중원소) 일부가 별 대기로 유입되는 ‘오염’이라는 설명이다. 즉, 옛날 태양처럼 젊었을 때 주변에 행성계가 있었고, 그 잔해가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판 마넨 2가 갖는 비정상적 칼슘선 역시, 오래된 행성계 잔해가 백색왜성을 뒤덮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이는 인류가 1917년 당시 모른 채 기록해 둔 “외계행성 시스템의 첫 단서”였다는 것이다.
후대까지 꼬박 한 세기가 지나서야, 이 별이 왜 그렇게 엉뚱한 불일치를 보였는지 해명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외계행성 존재’를 최초로 확실하게 공식 선언한 건 1992년이지만, 사실상 이미 1917년에 그 흔적을 발견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조그맣게 찍힌 스펙트럼이, 우리가 태양계 밖에 다른 세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감하게 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