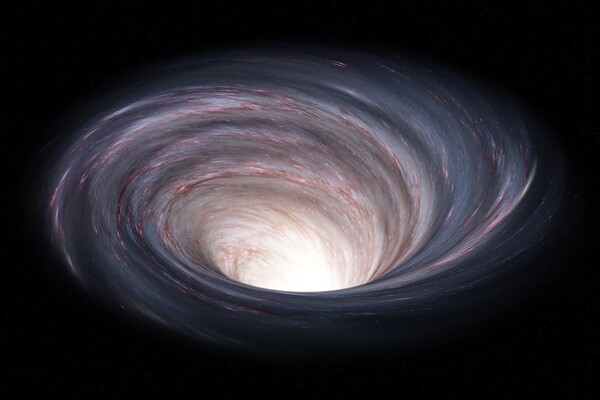
[미디어파인 = 이상원 기자] 별이 폭발하고 행성이 깨져도 물질은 남는다. 그러나 힉스장(場)의 값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진공 붕괴’가 일어나면, 원자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완전 무(無)의 우주가 도래한다. 과연 이런 최후는 가능할까? 물리학자들은 최신 입자 자료를 토대로 그 확률을 다시 계산했고, 결과는 “안심해도 좋을 만큼 작다”였다.
1964년 제안된 힉스장은 온 우주에 깔린 양자장으로, 전자·쿼크 등 모든 입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마스터 스위치’다. 현재 우주는 힉스장이 특정 값(진공기대값)에 고정된 ‘계곡’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언젠가 양자터널링으로 더 낮은 에너지의 진공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이때 생긴 거품이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면, 내부의 물리법칙이 완전히 달라져 기존 물질·생명은 소멸한다. 힉스 보손 질량(약 125GeV)이 측정되자 연구진은 붕괴 공식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2017년 하버드대 매슈 슈워츠 교수팀은 “지금까지 진공 붕괴 거품이 우리를 삼켰을 확률은 10^606분의 1”로 추정했다. 2024년 LHC의 더 정밀한 W-보손·쿼크 질량 데이터까지 반영하자, 확률은 10^868분의 1로 더 낮아졌다.
확률이 0이 아님은 우주가 ‘가짜 진공’일 가능성을 남긴다. 하지만 138억 년 동안 거품이 생기지 않은 사실 자체가, 힉스장·기본입자·우주 팽창 초기 조건 사이에 미지의 제약이 있을지 모른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슈워츠 교수는 “재앙은커녕, 진공 안정성 연구가 표준모형을 넘어선 새 물리학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868년은 1 뒤에 868개의 0이 붙는 시간이다. 지구 나이로 비교해도 상상조차 어렵다. 과학자들도 “인류가 맞닥뜨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그럼에도 이 극한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주의 ‘스위치’가 왜 지금 이 값을 택했는지, 물리학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에 답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