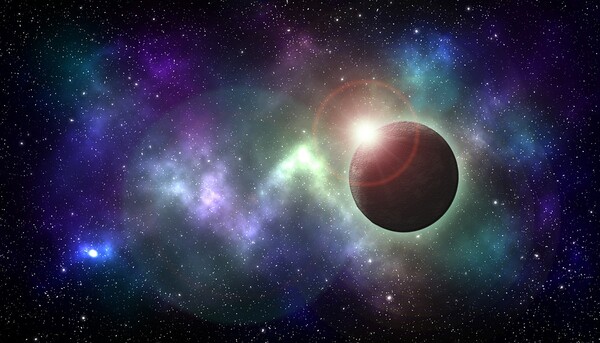
[미디어파인 = 이상원 기자] 별이 초대질량 블랙홀 곁을 지나면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 강력한 조석력(중력 차이)이 별을 실처럼 찢어 ‘스파게티화’시키고, 물질 절반가량은 우주로 흩뿌려지지만 나머지는 블랙홀 둘레에 원반(축적원반)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이 ‘조석교란현상(TDE)’이다. 은하 하나에서 백만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드문 사건이지만, 한 번 터지면 수억 광년 밖에서도 관측될 만큼 밝다.
천문학계는 그동안 블랙홀이 별을 삼킨 뒤엔 원반이 빠르게 소모돼 조용해질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 뜻밖의 관측이 이어졌다. 초기 섬광이 사라진 뒤 수년이 흐른 조용한 블랙홀이 다시 라디오파로 빛을 내며 ‘재점화’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보고다. 일종의 ‘우주적 트림’인 셈이다. 광원은 당연히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물질일 수 없다. 연구진은 블랙홀 주변에 남은 축적원반이 뒤늦게 뒤섞이며 물질을 밖으로 뿜어내기 때문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베일에 싸여 있다. 재점화 현상을 풀어내면 극한 환경의 물리 법칙과 블랙홀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처럼, 큰 은하는 대부분 태양 질량 수백만~수십억 배의 초대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다. 다만 태양이 지구를 ‘빨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블랙홀도 무작정 주변을 흡수하지는 않는다. 별의 궤도가 우연히 교란돼 가까이 접근해야만 비극이 시작된다. 별이 조석반경에 다다르면 중력 차이에 자체 중력이 버티지 못해 실처럼 늘어나고, 내부 핵융합도 즉시 멎는다. 몇 시간 만에 ‘별의 사망 선언’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절반은 튕겨나가고, 절반은 새 원반을 형성해 빛 폭발을 일으킨다. 지금까지 약 100건 가까운 TDE가 확인됐다.
TDE가 감지되면 전파망원경이 즉각 투입된다. 전파는 원반에서 밖으로 뻗어 나오는 물질 흐름(아웃플로)의 전자를 통해 발생한다. 이를 통해 폭발 에너지, 분출 속도, 자기장 세기, 주변 성간물질 밀도 등을 정밀 추정할 수 있다. 일례로 일부 아웃플로는 빛의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속도로 수광년까지 뻗어나가며, 그 궤적은 은하 핵 주변의 가스 분포를 알려주는 ‘우주 X선 촬영’이 된다.
문제는 ‘후폭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다. 초기 플레어가 끝난 뒤 원반이 비교적 안정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수년 혹은 수십 년 뒤 다시 물질을 뿜고 라디오파가 치솟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재분출 물질은 기존에 형성됐던 원반이 내부 마찰·불안정 현상으로 뒤늦게 무너져 내리며 나온 잔재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 지연 메커니즘은 아직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초대질량 블랙홀이 가끔씩 보이는 이 ‘소화불량’ 현상은 은하 진화 시나리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랙홀이 배출하는 강력한 입자·에너지 제트는 주변 가스를 가열·제거해 별 탄생을 억제하거나 촉진한다. 재점화 타이밍과 빈도, 방출 에너지 총량을 알면 은하가 언제 숨 쉬고 언제 잠드는지, 더 나아가 우주 대규모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전파망원경 네트워크는 후보 TDE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두 번째 불꽃’을 찾고 있다. 곧 가동될 초대형 전파망원경 SKA, 차세대 우주망원경 ‘로만 우주망원경’ 등이 가세하면, 블랙홀의 예측 불가한 만찬과 느닷없는 트림을 보다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