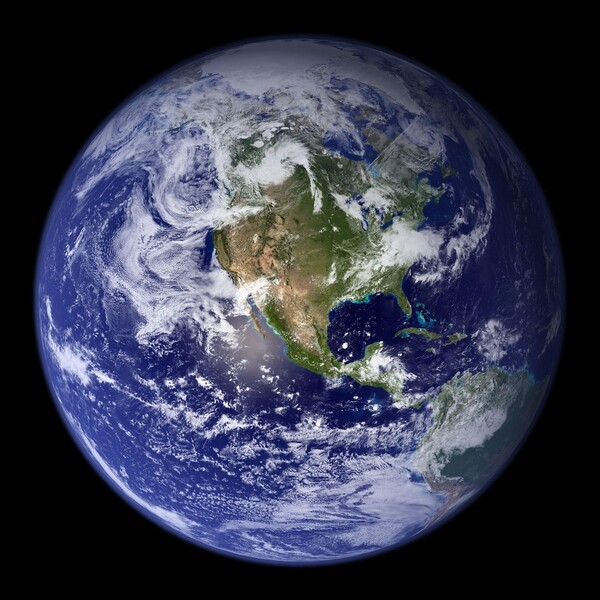
[미디어파인 = 이상원 기자] 은하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태양계는 한편으론 수천억 개 별로 붐비지만, 또 한편으론 별과 별 사이가 수십조 킬로미터나 벌어져 있는 ‘광활한 허허벌판’이다. 그러나 억 년 단위의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이 고요함도 깨진다. 약 8만 년 전 적색 왜성 ‘숄츠별’이 태양에서 불과 0.85광년까지 접근했고, 130만 년 뒤에는 ‘글리제 710’이 0.17광년 거리로 스쳐 지나갈 예정이다.
최근 행성과학 학술지 ‘이카루스(Icarus)’에 게재된 시뮬레이션 연구는 이러한 근접 통과가 태양계 역학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재평가했다. 연구진은 통상 수천만 년까지만 돌렸던 기존 모델의 한계를 넘어, 항성 질량·속도·거리 분포를 광범위하게 반영해 50억 년 동안 태양계 궤도를 추적했다. 그 결과, 외곽 왜소행성 플루토(명왕성)는 4% 확률로 태양계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안정성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다.
수성·화성·지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까지 행성 간 중력 상호작용만 고려했을 때 수성은 1% 확률로 태양 충돌 또는 태양계 이탈 가능성이 제시돼 왔으나, 인근 별의 중력 교란이 더해지면 위험도가 0.56%p 추가된다. 화성은 0.3%, 지구는 0.2% 확률로 궤도 불안정이나 추방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연구진은 “해당 확률은 극히 낮지만, 별들의 통과가 장기적으로 태양계 내 행성 궤도에 미세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수는 항성 통과로 해왕성 궤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그 영향이 천왕성·토성·목성을 거쳐 수성까지 전파되는 ‘도미노 효과’다. 수성은 궤도가 타원형이라 공명 현상에 취약하다. 목성과 일정 비율로 공전주기가 맞물릴 경우, 그야말로 ‘그네를 밀어 주듯’ 속도가 가속돼 태양 낙하나 태양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과가 당장 인류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가 가정한 시간축은 50억 년—태양계 나이와 맞먹는 거대한 스케일—이며, 향후 수백만 년 내로 근접할 별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연구진은 “가까운 시일에 더 현실적인 우려는 기후변화(수십 년), 중형급 소행성 충돌(수세기), 초화산 폭발(수십만 년), 초대형 소행성 충돌(수천만 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태양계는 지난 45억 년 동안 크고 작은 충격을 견디며 생명을 유지해 왔다. 별들과의 ‘우주적 스쳐 지나감’이 언젠가 판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최소 수백만 년 동안 지구는 여전히 우리의 보금자리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