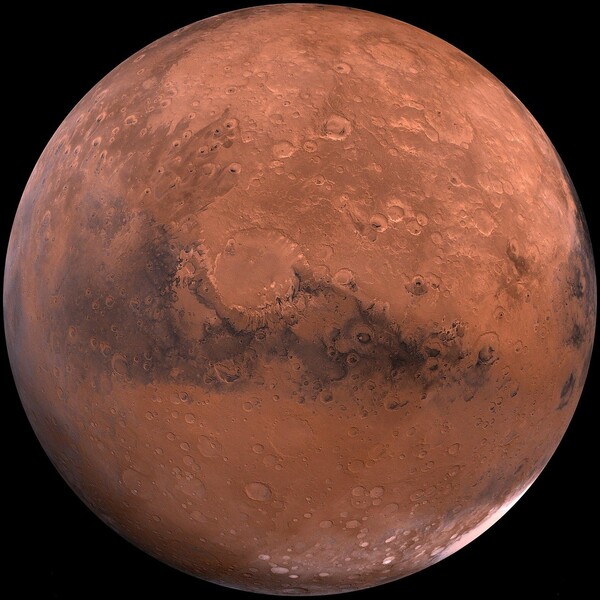
[미디어파인 = 이상원 기자] 화성 탐사 지질학 최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였던 경사선(slope streak·RSL)이 결국 ‘건조한 먼지 흐름’ 때문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적도 부근 절벽·충돌구 사면에 검은 실금처럼 길게 드리운 이 현상은 수십 년간 “지하에서 흘러나온 액체 물” 가능성을 시사하며 화성 생명 존재 논의를 부추겨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 연구팀이 인공위성 사진 8만 6,000장을 AI로 분석한 결과, 물 대신 바람과 충돌 여파가 만들어낸 먼지 사태로 결론 났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미국 브라운대·애리조나대·영국 옥스퍼드대 등 공동팀은 NASA 화성정찰궤도선(MRO) 탑재 ‘Context Camera’가 촬영한 전 행성 고해상도 사진을 머신러닝으로 판독했다. 그 결과 밝은 줄 1만 3,000여 개, 어두운 줄 48만 4,000여 개를 자동 추출했고, 누락 보정 등을 거쳐 최대 200만 개가량의 경사선이 존재한다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어 연구진은 경사선 분포를 화성 표면 온·습도, 풍속, 지형 경사도, 분진 퇴적량 등 다중 환경 데이터와 교차 분석했다. 그 결과 ▲햇볕을 정면으로 받는 남향 사면과의 연관성은 미약 ▲일교차 큰 지역보다 온도 변동 적은 곳에 주로 분포 ▲대기 습도 높은 구역보다 건조·먼지 퇴적 심한 구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는 ‘얼어 있던 염수(소금물)가 봄·여름에 녹아 흐른다’는 기존 ‘습식 가설’과 배치된다.
반면 연구진은 경사선이 ▲강풍이 잦고 ▲최근 소행성 충돌로 지표면이 교란된 젊은 충돌구 경사면에서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표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새로 생긴 지름 140m 충돌구 주변으로, 가파른 비탈과 풍부한 분진에 힘입어 경사선이 집중 형성됐다. 이는 지진이나 충돌 충격이 느슨한 먼지층을 허물어 사면 붕괴를 유발한 ‘건식 가설’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현 단계에서 경사선 형성에 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압도적 통계적 증거는 건조 기원 쪽”이라고 설명했다. 수년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재현성’ 또한 사면 위 먼지층 재퇴적과 재붕괴 주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과는 화성 지하 얕은 층에 액체 상태의 물이 상존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풀 꺾는 셈이다. 그럼에도 과학적 의미는 작지 않다. 연구팀은 “경사선이 운반하는 분진량을 환산하면, 매년 화성에서 관측되는 전지구적 먼지 폭풍 몇 회분에 달한다”며 “이는 화성 대기·기후 모델과 장기 인류 거주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일정 비율의 경사선이 ‘화성의 얼음 저수지’와 연결될 여지가 여전히 남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화성 남반구 화산지대 사면에서 간헐적으로 관측되는 경사선 중 일부는 지하 열원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팀 역시 통계적 한계(마스퀘이크·열류량 데이터 부족)를 인정하며 “후속 임무에서 장기 지진계·열 탐지망이 구축되면 가설을 보다 정밀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엔 여전히 과거 물이 흐른 흔적, 고대 해안선, 수분 기원 광물이 산재해 있다”고 연구 공동저자인 옥스퍼드대 행성과학자 아딧야 바산 박사는 말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 화성 표면 현상 중 상당수가 건조 기작임을 보여줬을 뿐, 지하 깊은 곳의 얼음과 물 탐사는 여전히 유효한 과제다.”
우주탐사계가 차세대 화성 로버·착륙선 설계에 반영할 새 변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대규모 AI 분석 역시 인간이 마주할 붉은 행성의 실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퍼즐 조각 가운데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