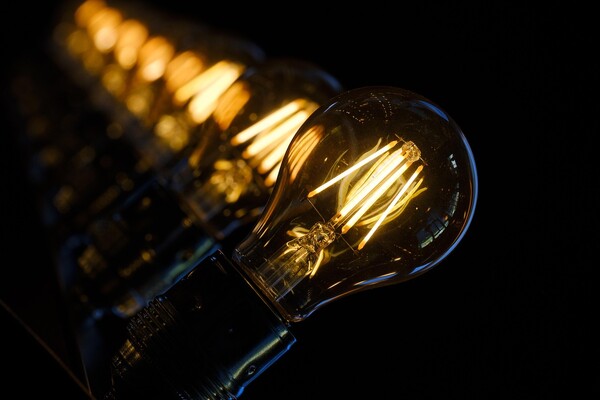
[미디어파인 = 이상원 기자] 어린 시절 벽돌 담장 옆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 보면, 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잠시 후 담 쪽에서 메아리로 돌아오곤 했다. 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 현상이다. 천문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주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소리가 아닌 ‘빛의 메아리’다. 빛도 소리처럼 유한한 속도로 움직인다. 초당 약 30만km라는 엄청난 속도지만,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거리에서는 결코 즉시 도달하지 않는다. 이러한 빛의 메아리는 때로 수년, 수백 년이 지나서야 지구에 도달한다.
빛의 메아리 현상은 대규모 폭발, 예를 들어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폭발하는 초신성에서 두드러진다. 초신성이 일어나면 빛은 구형의 파동으로 퍼져나가며, 그 과정에서 주변 가스와 먼지 구름을 비춘다. 이때 관측자는 주변 물질이 순차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장관을 보게 된다. 프랑스 천문학자 폴 쿠데르크가 1939년 처음 수학적으로 정리한 이 원리에 따르면, 관측자는 마치 컵 안을 내려다보듯 빛의 메아리가 퍼지는 모습을 본다. 실제로는 3차원 구조지만, 지구에서 바라보면 하늘에 원형 고리처럼 확산하는 형태로 관측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시각적 장관을 넘어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갖는다. 빛의 메아리는 초신성 주변의 가스와 먼지 분포, 물리적 성질, 심지어 폭발이 일어난 별의 형성 환경까지 알려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인근 은하 센타우루스 A에서 폭발한 초신성 SN2016adj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 폭발이 만든 확산하는 원형의 빛의 메아리를 포착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 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2002년 V838 외뿔자리 별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은 허블 영상에서 마치 먼지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냈다. 실제로는 먼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폭발의 빛이 주변 물질을 차례로 비추며 확산해 나간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이 현상이 두 별의 충돌과 합병에서 비롯됐으며, 해당 별이 지구에서 약 2만 광년 떨어져 있음을 밝혀냈다.
빛의 메아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수학과 물리학을 통해 분석하면 우주를 탐구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모한다. 이 현상은 과거의 사건과 그 주변 환경을 마치 시간여행 하듯 재구성하게 해주며, 동시에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